김민애 칼럼 [어느 책모임 중독자의 고백]
『나목』 (박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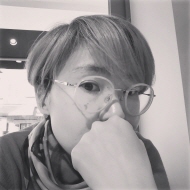
“엄마, 그때 왜 그랬어?”
“그때? 언제? 내가 뭘?”
“왜, 어렸을 때 밥 차려 놓았으니까 밥 먹어라, 하고 불러서 나가면 밥상에 내 숟가락만 없었잖아. 아빠랑 오빠, 엄마 수저는 다 놓고서는, 딱 내 것만 빼놓고. 한 번도 아니고 늘, 번번이.”
“그랬냐? 난 기억에 없는데? 넌 참 별거도 다 기억한다.”
사실 어린 시절, 밥상에 숟가락이 없을 때마다 핏대를 세웠다. 왜 내 숟가락만 잊어버리냐고. 그때마다 엄마는 ‘야, 니가 갖다 먹으면 되잖아’로 응수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뭔가를 갖고 싶다는 내 욕망은 늘 성적이나 상장으로 충족될 수 있었다. 딸한테는 다소 냉정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했다. 욕망을 별로 내세우지 않는 아들한테는 뭐든 군말 없이 지원해 주었다. 내 경우에는 달랐다. 종이 건반으로 양손 주법까지 익힌 다음에 피아노 학원을 다닐 수 있었고, 1년 뒤에야 피아노를 얻었다. 세입자 전세금을 올려 받은 돈으로 구입했다는 말과 함께. 그 불필요한 정보 때문에 피아노를 칠 때마다 세입자의 피눈물 흘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고등학교 1학년. 교외 문학 서클 활동에 푹 빠져 지내는데, 오빠가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자기 학교 후배들과 내가 얽히는 것이 싫다는 것이 이유였다. 엄마도 거들었다. ‘네 오빠가 하지 말라잖니.’ 오빠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결혼 이후로 나는 엄마의 하나뿐인 내 딸이 되었다.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은 간섭과 잔소리가 폭풍우처럼 휘몰아쳤다. 오빠와 아빠 사이의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빚어지는 무겁고 시끄러운 감정을 온통 내게로 쏟아 냈다. 차라리 예전처럼 무관심이 더 나을 뻔했다. 휴대 전화 액정에 엄마라는 이름만 떠도 가슴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다. 그러다 결국 엄마가 결정타를 날렸다.
“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아들놈은 장가를 안 가, 딸년은 새끼를 안 낳아. 내가 아주 친척들 사이에서 얼마나 면이 안 서는 줄 알아? 다른 사람들은 손주 보는 재미로 늘그막에 재미나게 산다는데, 자식새끼들이 하나같이 불효나 하고!”
감정이 격해져서 쏟아 낸 말이라 이해하려고 해도, 상처받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애를 못 낳는 거면 어쩌려고, 라는 말이 목구멍 위로 치밀고 올라왔지만 꾹 삼켰다. 시쳇말로 엄마는 선을 넘었다. 이해를 넘어선 포기와 인정 단계로 접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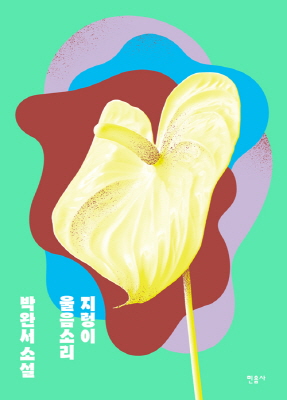
故 박완서 작가의 첫 작품 『나목』에서 주인공 이경에게 감정 이입된 건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으리라. 아무리 전쟁 전후로 남편과 금쪽같은 두 아들을 잃었다고 하나, 유일하게 살아남은 딸에게 그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 두 오빠의 죽음에 딸이 죄책감을 느끼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말이다.
아들 흔적이 남은 빈집에 허깨비처럼 우두커니 앉은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에게 차마 살아 숨 쉬는 자신 좀 봐 달라는 말도 할 수 없는 딸. 이경은 엄마의 성의라고는 요만큼도 담겨 있지 않은 밍밍한 김칫국과 밥을 꾸역꾸역 밀어 넣는다. 정신을 놓을지 모르는 엄마를 혼자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 공간에 같이 있자니 숨이 막힌다.
이런 상황에서 이경이 제 또래 남자의 치기 어린 연애 수작질에 넘어가지 않고 삶의 무게를 잔뜩 짊어진 옥 선생에게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답한 현실에서 꺼내 줄 탈출구도 될 수 없는데 말이다. 그에게서 아버지와 두 오빠의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고,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곁은 내주지 않는 엄마 대신에 그 남자를 엄마처럼 보듬어 주고 싶어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소설은 옥 선생이 그린 황량한 나무 그림이 사실은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나목이라는 것을, 이경이 한참 후에 알게 된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전쟁 전후의 각박하고 비참한 현실보다 엄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이경의 꿈틀거림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반짝반짝 꽃 피웠을 이경의 청춘이 일찌감치 고목으로 말라비틀어진 듯 보였다.
중요한 건, 수십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나목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