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칼럼 [어느 책모임 중독자의 고백]
『나를 보내지 마』 (가즈오 이시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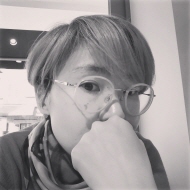
[고양신문] 영화 <더 록>과 <트랜스포머> 감독으로 잘 알려진 마이클 베이가 2005년에 만든 <아일랜드>. SF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엉성한 설정으로 외면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도 흥행에 참패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300만 명의 관객을 불러들일 만큼 사랑을 받았다. 나 역시 ‘복제 인간’을 소재로 한 이 영화를 좋아한다. 일단 이완 맥그리거와 스칼렛 요한슨이 출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인공들이 자신들을 보호했던(사실은 가두고 사육했던) 곳에서 탈출하기까지의 과정이 충격적이면서 긴장감 넘친다. 영화의 전반부와 달리 후반부는 뻔하디 뻔한 추격 장면의 연속이라 관객의 평가가 박한 듯하다.
그럼에도 병에 걸릴 경우 자신의 복제 인간 장기로 치료한다는 설정 그 자체는 매우 빛난다. 특권층의 이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발상은 어쩌면 우리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욕망일지도 모르기에 더 섬뜩했다. 만약 모든 인간에게 이러한 기회가 똑같이 주어진다면, 과연 윤리라는 잣대로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가 2005년에 출간한 『나를 보내지 마』에서도 ‘복제 인간’이 주인공이다.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기숙 학교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캐시, 루스, 토미의 이야기다.
인간의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복제된 이들의 이야기라는 소재는 새롭지 않았다. 그런데 500페이지에 가까운 장편 소설은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도대체 인간의 이기심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뻔한 주제가 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일랜드>의 복제 인간과 달리 처음부터 자신들의 존재를 알고 있고, 결국 자신들이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죽음을 맞이하는지 인지하고 있다.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 ‘들었으되 듣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며 이들은 자신의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인다.
물론 그들이라고 해서 의문을 전혀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복제 인간으로서 어차피 최대 네 번의 장기 기증을 하고 죽을 운명이라면 어째서 학교 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을까? 그림이나 시를 통해 예술성과 창조성을 기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간병사의 삶을 선택한 캐시는 장기 기증자의 삶을 유예받았다. 하지만 곧 은퇴를 하기에 다시 정해진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 미래를 한 번 더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복제 인간과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다고 검증을 받는다면 3, 4년 정도 평범한 인간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아니, 이것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풍문이다. 그러나 돌고 돌아 다시 만난 토미는 이미 세 번의 장기 기증을 한 터였기에 한번 시도해 볼 만한 풍문이었다. 그렇게 소문을 좇아 기숙 학교 교장까지 만난 이들은 사랑을 검증받았을까? 장기 기증자의 삶에서 잠시나마 벗어났을까? 학교에서의 교육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들었을까?
복제 인간을 통한 장기 기증의 윤리적 문제. 이 소설에서는 이런 걸 논하지 않는다. 어쩌면 작가는 가까운 미래에 이런 과학기술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도덕이나 윤리적 문제는 논의할 필요도 없이 금세 합의될 수도 있다. 이들 복제 인간에게 삶의 형태와 죽음의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어떤 식으로 지켜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작가는 독자에게 던지고 있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스스로를 장기 기증자일 뿐이라고 폄하하는 것보다 하루하루 평범한 인간처럼 웃고, 울고, 화내고, 싸우고, 사랑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냐고 교장은 말한다. 비록 이제는 ‘교육’이나 ‘실험’으로 인간을 능가하는 복제 인간이 등장할까 봐 정부에서 거대한 ‘사육장’만 운영할 뿐이지만.
모든 비밀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두 친구를 잃고, 아름다웠던 유년 시절도 희석되어 버린 캐시. 그래도 그녀는 흐느끼지도, 자제력도 잃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간다. 나는 그 의젓함이 애잔하고 쓸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