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칼럼 [어느 책모임 중독자의 고백]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호프 자런, 김영사 刊)
[고양신문] 작년 봄 이사를 하면서 살림을 대폭 줄였다. 새 집에 새 살림을 꾸리고 싶은 욕망도 없지 않았으나, 진짜 이유는 수납 공간이 확 줄었기 때문이었다. 언젠간 쓰겠지, 하고 쟁여 두었던 플라스틱 반찬통을 싹 버렸다. 그다음 정리할 항목은 입지 않는 옷. 정말 낡아서 버리는 거라면 뭐가 문제일까. 몇 년째 입지도 않은, 앞으로도 입을 일이 요원한 옷을 김장용 비닐에 욱여넣었다. 싼 맛에 사서 몇 번 입고 옷장에 처박아 둔 것들이었다. 재활용 수거업체를 불러서 무게를 달아 보니 80킬로그램이었다.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후로 당분간은 절대 옷을 사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옷이야 헐벗은 몸만 가리면 될 뿐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 최근 나는 다시 옷가지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입을 옷이 마땅히 없다는 자기 합리화와 마음이 허할 땐 쇼핑이 최고라는 이유로. 빈 옷장이 다시 차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과거의 전철을 밟게 되고 마는 것일까.

지난 12월 17과 18일 ‘2021 고양 전국 독서토론 한마당’이 열렸다. 여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중 나는 18일 현장 독서토론에서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의 모임 진행을 맡았다. 『랩걸』의 저자 ‘호프 자런’이 쓴 생태주의 에세이였다. 지구와 작별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엄중한 경고를 딱딱하고 재미없는 과학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목소리로 들려준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는 우리보다 더 많은 과학적 데이터를 알고 있고, 지구 환경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은근히 조곤조곤한 말투로 우리를 각성시킨다.
모임에 참여한 시민은 나를 포함하여 다섯 명. 기후 위기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가볍게 시작했다. 인생 선배님들답게 일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 운동을 실천하고 있었다.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플라스틱. 분리수거 할 때마다 죄책감이 따라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일까. 꼭 필요한 것만을 사는데도 딸려 오는 각종 쓰레기가 정말 우리의 잘못일까? 많은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소비하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너무 많이 소비해서 쓰레기를 끊임없이 배출하고, 누군가는 그 쓰레기를 파먹고 살거나 소비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굶어 죽는다. 이것은 분배의 문제이다.
2015년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FCCC)은 파리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서명한 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청정 기술 개발, 나무 심기, 화석연료 관련 긴축 등 스스로 계획을 세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늘어났고, 그 다음해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되었다.
파리 기변화화 협정에 서명한 175개국이 기후 위기의 위험성을 간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선시되는 것은 지구가 아니라 당장 눈앞의 이익일 것이다. 기업은 지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가 수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은 우리가 과도하고 소비하는 것도 원인이지만, 상품 자체보다 포장재를 더욱 신경 쓰는 기업들 때문이리라. 우리에게는 쓰레기 배출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소비를 주체적으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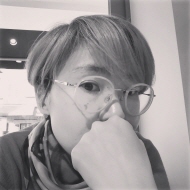
이 책의 원제는 『The story of more』다. 원제가 직관적인 메시지를 던져 준다면, 의역한 제목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던져 준다. 바로 당신이 풍요를 찾았기에 지구가 이 모양 이 꼴인 거라고. 물론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욕망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요를 우리가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감히 단언하건대, 우리는 풍요를 강요당하고 있다. 바로 기업에 의해서. 최근 미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담수균류가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어떤 식으로든 지구는 자정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쓰레기를 계속 배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풍요로워져야 했고 지구는 계속 달라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