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혜의 발랑까진]

[고양신문] 이번 대선에서 ‘이대녀’의 표는 화제가 되었다. 민주당을 향한 여성 청년들의 전략 투표는 '이대녀’도 “표가 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일깨웠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청년 지지자는 ‘개딸’이라 불린다. ‘성질머리가 대단한 딸’이라는 원래 뜻에 ‘개혁의 딸’이라는 의미가 더해진 호칭이다. 여성 청년을 ‘개딸’로 지칭하는 기사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정치에서조차 20대 여성은 딸이 되는구나.”
찝찝한 장면은 하나 더 있었다.
“우리 언니, 우리가 도와줍시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심상정 전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며 한 말이다. 심상정 후보를 낯설고 어려운 정치인이 아닌, 가깝고 든든한 ‘친언니’ 같은 존재로 그리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언니’는 전통적인 가족관계에 기대고 있으며, 나이에 의한 위계를 내포하는 호칭이다. “멋있으면 다 언니”라는 유행어가 가리키듯, 언니는 ‘더 많이 알고 있는 우월한 지위’를 상징한다.
정치인이 자신의 위계를 허물고, 시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다. 그러나 그 방식이 가부장적이고 연장자 중심적인 가족관계의 호칭을 답습한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가족관계에서 어린 여성은 가부장/연장자에 의해 보호받는 존재로, 때로는 어른과 남성을 보필해야 되는 존재로 여겨진다. 이십대 여성에게 정치권이 붙인 ‘개딸’이라는 호칭도 다르지 않다. 세상은 ‘개딸’에게 지지자의 자리만을 내어줄 뿐, 자신의 삶을 바꿔낼 정치권력을 쥐어주지는 않는다.
여성 청년인 나는 민주당에 투표할 수도, ‘개딸’이 되기를 선택할 수도 없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의 행보를 응원하면서도,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었다. 50대 남성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력을 바꾸지 않은 채, 일부 여성만이 고위직에 진출하는 것을 성평등한 정치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불평등을 강화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정치는 페미니즘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성으로서 나의 정치는 특정한 정체성만을 대변하는 일이 아니라, 사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여성 청년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했다. 그러나 여성 청년에게는 ‘덜 나쁜 선택지’가 아닌, 괜찮은 선택지를 고를 권리가 있다. 나아가, 한정된 선택지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나갈 권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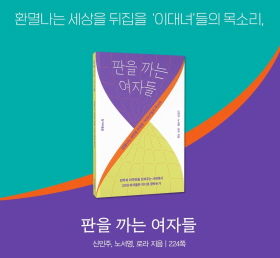
대통령 선거의 끝맛이 씁쓸할 즈음, 동료들이 출간한 책이 나왔다. 『판을 까는 여자들』이라는 책이었다. 책을 읽으며, 나는 여성 청년이 낡고 고루한 정치판 속 장기말 하나로 소비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랐다. 정치의 판 자체를 갈아엎고, 새로운 판을 까는 페미니스트 정치인이 더 많아져야 한다. 여성 청년이 ‘개딸’로만 남지 않고, 더 많은 이름으로 정치할 수 있는 세상이 필요하다.
나는 2022년 지방선거에 경기도의회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한다. 내가 꿈꾸는 경기도는 어리거나 여성이어도, 똑똑하지 않고 돈이 많지 않아도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다. 내가 하고자 하는 페미니즘 정치는 여성의 권리를 대변하는 동시에, 나이에 의한 차별을 없애는 정치다. 학벌주의를 타파하는 동시에, 기본소득으로 사회경제적 빈곤을 해소하는 정치다.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페미니즘 정치가 보다 다양하고 풍부해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