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희의 마음이야기-

[고양신문] 월요일 아침마다 별구경을 했다. 가장 많이 팔렸으나 안 읽은 책 1위라는 『코스모스』를 3개월이나 봤다. 양서라고 해서 샀고, 읽으라고 추천해서 사고 말았으나 막상 펼치면 졸음이 쏟아지는 책이다. 책 두께도 베개 대용으로 손색이 없는 장장 700페이지 분량이다. 마침 고양시 평생학습에 천문학자인 이명현씨의 과학책 읽기 모더레이트 과정이 생겨서 용감한 아줌마인 필자도 호기롭게 참여하였다.
10여 명의 여성들이 모여 우주를 넘나들었다. 먼 길도 동무가 있으면 쉽다더니 덕분에 행군을 마쳤다. 매주 읽어온 부분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명현 박사의 강의를 듣는 과정이어서 다시 대학에 간 기분이 들 정도였다. 읽은 책을 내 책으로 소화시키기 어려워서 필자는 한 번도 발표를 하지 못했으나 소싯적에 이과생이었던 소질을 발휘하는 이들도 있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서 파생한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는 이는 감명을 주기도 했다.
책에 대한 칼럼을 쓰는 일이 어색한 사례는 아니나, 산으로 치면 히말라야 산맥 등반 같았던 과정이었던지라 쓰지 않고서는 허무할 듯하여 적어본다. 과학책인지 역사책인지 생물학책인지 휴머니즘책인지 헷갈릴 정도의 저자의 방대한 지식에 곧잘 잠의 세계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실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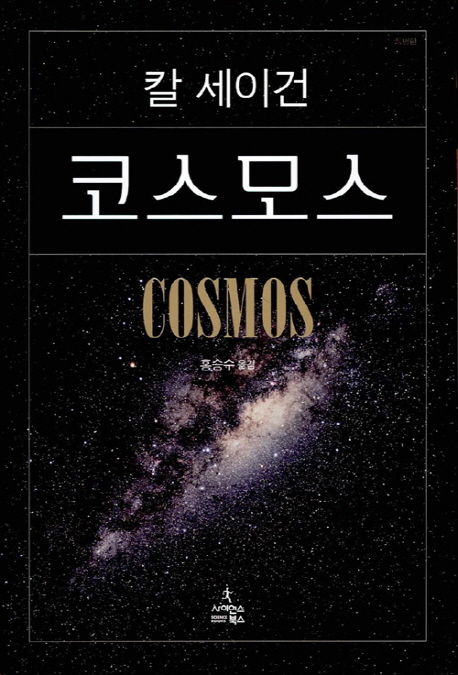
『코스모스』는 80년대에 나온 책인데 지금까지도 전세계 사람에게 방대한 지식과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다. 저자 칼 세이건의 색을 입힌 우주 이야기에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외치는 인류애가 절절히 담겨있었다. 유시민씨가 ‘나를 둘러싼 세상과 친해지고 싶어서’ 읽었다는 『코스모스』다. 우주에는 지구만 있는 것도, 나의 세상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게 해준다. 넓고 광활하다 못해 산술로 측량하기도 어려운 규모의 우주 속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나는 별을 사랑한다. ‘별’의 프랑스어 ‘etoile(에뚜왈)’을 10년 넘게 애칭으로 쓸 정도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별은 어떤 실체가 있다기보단 나의 감수성을 반영하는 또 다른 세계의 그 무엇이었다. 어린 왕자의 별, 윤동주의 별, 가까이로는 BTS가 ‘난 오늘 밤 별들 속에 있다’고 부른 노래 속의 별 말이다. 세이건이 보기에는 답답하고 우매해 보였을 별의 신화, 별에 대한 환상 이야기에 익숙하다.
어느 거대 초신성의 폭발로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져 모두 동일한 원소를 가지고 있다거나, 동그라미를 손가락 열 개로도 모자랄 만큼 붙여야 되는 과거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라거나, 시간은 없다거나 하는 천문학 얘기는 내 뇌의 총량을 벗어난 얘기였다. 심학산 오르는 체력밖에 안 되는 사람이 히말라야 등반을 따라갔다.
다만 심리상담사로서 읽은 『코스모스』는 역시나 저자의 심리가 느껴졌다. 세이건의 부모는 우크라이나인으로,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와서 칼 세이건을 낳았다. 소수 이민자가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낯선 미국땅에 들어와 산 인생. 새로운 언어를 익히고 풍습을 익히며 흘린 피, 땀, 눈물 그 속에서 칼이 성장한 것 아니겠나. 마지막 장의 제목은 더욱 그의 심리를 드러낸다.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쓴 문장이다. 외계인일 수도 있고, 소수 이민자가 본 미국의 권력자에 대한 말이기도 할 것이다. 미국의 적대국인 소비에트연방 우크라이나 출신으로서 칼은 전쟁에 대한 고민을 오래 한 모양이다. 중년이 되어서도, 우주를 논하면서도 외친다. 전쟁을 그만두자고, 미·소가 협업하라고 말이다.
“우리는 종으로서의 인류를 사랑해야 하며, 지구에 충성해야 한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은 우주 개발을 통해 소련을 이기고 강대국이 되려는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다. 그러나 세이건은 거듭 초청을 거절하며 정치와 타협하지 않았다. 미·소가 협업하면 우주탐사도 쉽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정치세력의 이기심은 세이건을 괴롭혔다. ‘우주에 나가는 우주인은 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우주협약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것도 칼의 끊임없는 설득과 노력 덕분이리라 본다.
참고로, 새벽에 깨는 습성이 있는 중년이라면 『코스모스』를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것을 권한다. 읽다가 잠이 쉬 들 수 있어 좋기도 하거니와 어쩌면 뇌가 스스로에게 ‘그 책을 다시 만나느니 잠에 깨지 말자’라고 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