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칼럼 [어느 책모임 중독자의 고백]
마이클 온다치 『잉글리시 페이션트』
“아니, 그래서 이 영국인 남자의 정체가 뭐라는 거야?”
장편소설의 절반이 넘어가는데도 남자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남자가 인용하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속 구절, 발음하기 어려운 아프리카와 이탈리아 지역 이름이 툭툭 튀어나와 읽는 내내 고통스러웠다. 작년 봄, 다섯 명으로 시작했던 『The English Patient』 원서 읽기 모임. 매주 각자 4페이지씩 맡아서 읽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드디어 6월 28일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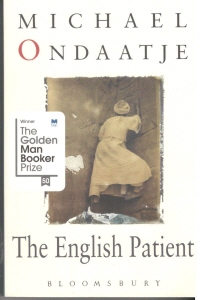
전반부가 꽤나 지루해서인지 초반에 세 명은 중도하차했다. 나를 포함한 나머지 두 명도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절반을 한참 지나서였다. 이 작품은 1992년 맨부커상을, 2018년에는 골든 맨부커상을 수상했단다. 일단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고 하니,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있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잉글리시 페이션트가 누군지는 알아야겠다는 목적으로 읽어 나갔다.
이야기 전체를 끌어가는 것은 ‘영국인 남자’(사실은 영국인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다. 처음 발견했을 때 영국인이라고 추정하고 ‘잉글리시 페이션트’라고 기재해서 야전병원으로 옮겨진 것)이지만, 현재 상황을 짚어 주는 인물은 인도인 영국 공병 ‘킵’이다.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고, 킵은 인종이나 대륙 간의 편견 없이 세계 대전에 영국군으로서 참전한다. 그는 폭탄 제거반에 소속되어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 임무를 수행한다. 1945년 그는 이탈리아의 허물어진 수도원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간호사 한나, 불에 탄 영국인 남자, 전쟁 중 손목을 잃은 카라바조를 만난다. 적군이 훑고 지나간 이곳에서 그의 새로운 임무는 지뢰나 폭탄으로부터 이들을 지켜 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나중에 이중첩자로 밝혀진 ‘영국인 환자’(사실은 영국인도 아니었다. 헝가리인이었고 실명은 알마시)의 불같은 사랑도, 각자의 상처를 지닌 킵과 한나의 인종을 뛰어넘는 사랑도 아니었다. 작가가 지루할 정도로 세밀하게 묘사해 놓은 전쟁의 참상이었다. ‘무너진’, ‘불빛’, ‘유물’, ‘오아시스’, ‘지도’, ‘폭탄’, ‘바람’, ‘모닥불’, ‘텐트’, ‘생명’ 등의 단어들이 여러 문장에서 반복 등장하면서 전쟁이 얼마나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들어 내는지를 보여 준다. 이 와중에 네 남녀의 사랑은 초에 켜진 불빛일 뿐이었다. 촛농이 다 녹아내리면 그대로 사그라져 버리는.
1945년 8월. 종전으로 치달아 가는 어느 여름날, 무전기를 통해 바다 너머 소식을 듣게 된 킵. 푸른색 섬나라에 두 개의 폭탄이 떨어졌단다. 그동안 자신이 해체했던 폭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폭탄이. 백인의 대륙에는 절대 투하되지 않았을 거라는 카라바조의 말에 킵은 당장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총으로 쏘아 버릴 기세다. 자신을 이 먼 땅으로 이끈 영국에 대한 분노를 ‘영국인’에 표출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리라.
아시아인임에도 불구하고 백인의 목숨을 끝까지 지켜 줄 생각이었는데, 정작 백인은 아시아인을 향해 폭탄을 투하하다니. 이대로 전쟁이 끝나고 부대에 복귀해서 훈장을 받더라도 킵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원래 맏아들이 입대했어야 했는데, 입영 거부로 감옥에 갇힌 형을 대신해 전쟁터로 내몰린 킵. 킵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렇게 목숨 바쳐 폭탄을 해체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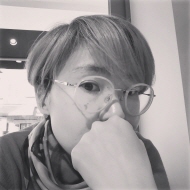
이제 마지막까지 8페이지가 남았다.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다. 일본 패망이 곧 우리의 광복이었기에, 2차 세계대전의 종결은 그저 당연하게만 받아들여졌다. 사필귀정. 그런데 카라바조의 말처럼 만약 일본이 아니라 독일이 끝까지 항전했다면, 미국은 유럽 대륙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을까? 자신에게 대항한 나라가 아시아이고, 게다가 섬나라여서 버튼을 눌렀던 게 아닐까. 카바라조의 말을 자꾸만 되씹게 된다.
“그들은 백인들의 국가엔 결코 그런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았을 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