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석 칼럼 [내일은 방학]

[고양신문]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다. 소식이 없는 것은 무사히 잘 있다는 뜻으로 보통 자주 연락하지 못할 때 상대에게 섭섭하지 말라는 의미로 쓰이곤 한다. 반대로 상대에게 연락이 없어 걱정될 때 자기 안심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마땅히 안부를 전할 매체가 부족했던 과거에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큰 위로가 되었다.
지금은 어떨까? 일단 하루에도 수십 개의 소식이 우리의 방을 채운다. 어렸을 때 내 방이 없었던 설움에 복수라도 하듯 우리의 핸드폰 속에는 참 많은 방이 있다. 소속된 단톡방, 얼굴 책(facebook)의 친구, 인스타그램에 팔로워수가 많을수록 ‘인싸’가 되고 ‘인플루언서’가 된다.
시집간 딸이 지나가는 제비를 보며 우리 아버지께 잘 있다는 소식 좀 전해달라던, 호랑이 연초 피우던 시절은 군대 간 아들이 실시간 영상통화를 통해 ‘엄마, 용돈 좀 더 보내줘’라는 호랑이 전자담배 태우는 시절로 변했고 무소식은 이제 단절, 격리를 의미하게 되었다. 일상에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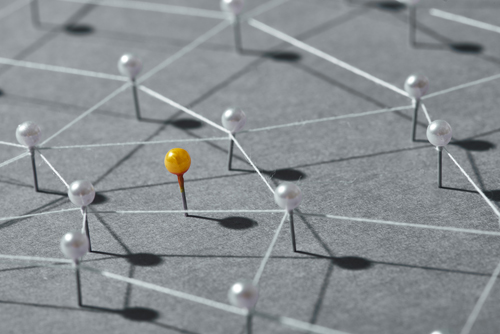
그런데 말이다. 과연 정보화 사회의 등장,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 녀석(무소식이 희소식)의 실종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 어쩌면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어서가 아닐까?
수학여행을 떠난 자녀가 8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회에서 무소식은 희소식일까? 일찍 취업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현장실습 나간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회에서 무소식은 희소식일까?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회, 그 이상 열심히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 노동자에게 계약만료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고 문자가 날아오는 사회에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은 아마 실종이 아닌 가출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다.
어렸을 적 밤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생각난다. 술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웃지 않으려고 얼굴을 하늘로 향했던 그때, 도시에서도 별은 볼 수 있었다.
별 볼 일 없는 요즘. 별일이 참 많이 일어난다. 음주운전, 갑질 등으로 임명 논란이 됐던 신임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입학을 꺼내 들었다가 34일 만에 사퇴했다. 이미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된 낡은 서랍 속의 정책을 소위 표지갈이해서 내놓으니 저작권 위반은 스타 장관의 필수 이력인가보다. 가뭄에 그렇게 절실했던 비 소식이 지금은 분노와 슬픔이 되어 먼저 퇴근한 나랏님의 핸드폰만을 응시하게 한다. 들리는 소식마다 소주 한 잔을 부르니 가출한 무소식도, 희소식도 돌아오긴 어려울 것 같다.
개학이 다음 주라는 이 비통한 소식을 전하고자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다. 별일 없었냐는 물음에 대답이 똑같다.
“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우문현답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 되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누군가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