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형만 시인은 내년이면 등단 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까지 낸 스무 권의 신작시집은 ‘시를 써야할 때 쓰지 않으면 정작 시를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다’라는 신조를 지킨 결과다. [사진 =유경종 기자]](https://cdn.mygoyang.com/news/photo/202212/70848_95127_3047.jpg)
내년 등단 50년 허형만 시인
20번째 신작시집 『만났다』
시와 숲에 대한 깊은 사유
[고양신문] 원당에 살고 있는 허형만(77세) 시인이 스무 번째 시집 『만났다』(황금알)를 펴냈다. 1973년 『월간문학』을 통해 등단했으니 내년이면 등단 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50년 동안 신작 시집으로만 스무 권을 펴냈으니 산술적으로 평균 2.5년마다 새로 쓴 시를 모아 시집을 발표한 셈이다. 단순히 ‘성실하다’라고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시에 대한 대단한 열정이다. 허형만 시인은 “이미 써놓은 시들을 제때 묶어서 펴내야 이후에 새로운 시를 쓸 수 있다. 마치 고인 물을 퍼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집 『만났다』에서도 이전 시집처럼 시창작과 연관된 시인의 사유를 담은 시가 많이 나타난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지금 써라’ ‘이유’ ‘나는 오늘도 시를 쓴다' ’시의 벼랑’ 같은 시들이 그렇다. 50년 동안 시를 붙잡고 있었지만, ‘더 나은 시’를 향한 고뇌는 시인을 놔주지 않는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 써야 할 것들이 많은데 / 보드라운 이 아침 /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나무 / 손톱까지 선명한 / 나무의 저 손가락을 /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전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물음은 시인을 평생 따라 다닌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과 환희는 시인에게는 숙명과 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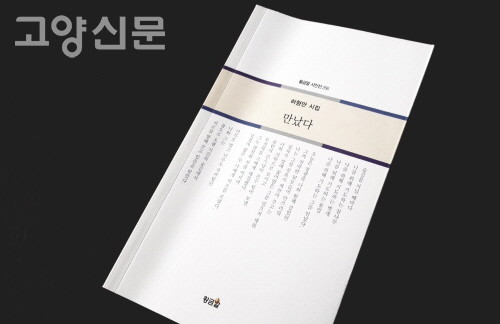
허형만 시인은 “저의 신조는 ‘시를 써야할 때 쓰지 않으면 정작 시를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다’라는 것이다. 특히 시마(詩魔)가 시인을 찾아왔을 때 귀찮다고 미루면 안 된다. 시마(詩魔)가 이미 써놓은 시의 특정 구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가르쳐준다. 가르쳐준대로 고치면 더 나은 시가 되어 있다. 아마 시마(詩魔)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시인의 잠재의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허형만 시인은 올해 1월 한국가톨릭문인회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후 가끔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에 들르기도 하고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 양성우 시인과 가끔 만나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한 때 나는 / ’겨울 공화국‘에 살 때 / 그는 감옥에서 잠을 설치고 / 나는 뒷골목에서 깡술을 마셨지 // 한 때 내가 / 잠시 지리산 천은사에 지내던 중 / 그가 먼저 이곳에 은거하며 시를 썼다는 / 스님의 말을 지금도 기억하지’(시 ‘양성우’ 중에서)라며 시인과의 인연을 이야기 한다.
허형만 시인은 목포대 국문과 교수 퇴임 후 6년 전부터 고양시 원당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늘 시를 생각하고 있지만 매일 아파트 주변 성사체육공원 인근 나지막한 산의 숲길을 걸을 때 시심이 좀 더 깊어지는 듯하다. 공초문학상 수상작으로 이번 시집 『만났다』에 담긴 ‘산까지’도 이곳 숲길을 걸으면서 쓴 시다.
허형만 시인은 이번 시집 『만났다』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분히 신앙적인 정서가 녹아 있다. 또한 팬데믹 때문인지 매일 성사체육공원을 한 시간 정도 걷다보니 숲에 관한 시를 많이 쓰게 됐다. 그러다보니 숲속에 있는 생명에 대한 사유도 하게 되고 환경문제까지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허형만 시인은 “이미 써놓은 시들을 제때 묶어서 펴내야 이후에 새로운 시를 쓸 수 있다. 마치 고인 물을 퍼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말했다. [사진 = 유경종 기자]](https://cdn.mygoyang.com/news/photo/202212/70848_95128_3113.jpg)
이번 시집에는 유독 ‘숲’이라는 시어가 많이 등장한다. 시인은 나뭇잎에 햇발이 반짝인다고 여기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만든 편견이고, 숲은 밤낮없이 주변의 별들이 은하수처럼 출렁이는 곳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시인은 ‘숲의 언어로 숲의 정령과 장난치며 뛰어노는 철부지가 되고 싶은 꿈’을 꾸기도 하고 숲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배운다.
‘나는 내가 얼마나 작은 지를 / 숲에서 배운다. // 나보다 작은 키의 풀을 꽃을 피우고 / 나보다 작은 몸집이 작은 나무에 새들이 쉬었다 간다. // 그러니 숲에서 나보다 더 작은 것은 하나도 없다 (시 ‘숲에서 배운다’ 중에서)
이번 시집 『만났다』의 표제시는 시집의 맨 마지막에서 ‘만날 수’ 있다. ‘만났다’라는 시에 대해 권성훈 문학평론가는 ‘허형만 삶의 태도를 관통하는 이 시는 이번 시집의 마지막에서 앞에 놓인 시편들의 전체 하중을 견디면서 시인의 세계관을 페이소스하고 있다’라고 평하고 있다.
만났다
숲길을 거닐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참나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멧새
나를 위해 기도하는 풀잎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를 만났다.
오늘은 평생을 나와 함께 걸었던
그의 연약한 뒷모습이 안쓰러워
나는 그를 살포시 껴안아 주고는
십자가 앞에 꿇어앉은 그를 일으켜 세워
나의 식탁으로 모시고
보림사 큰스님이 손수 덖어 보낸
우전차를 그에게 대접했다.
그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낯설지 않은 듯 나에게 미소를 보냈다.
너무도 멀고 너무도 가까웠던
나와 그는
참으로 오랜 시간 숲길에서
서로를 향해 걷고 있음을 알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