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석 칼럼 [내일은 방학]
[고양신문] 지난 2월 23일 교육부는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 분야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는 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백년지대계라고 해놓고 매일 옷을 갈아입는 우리 교육의 정체를 25년 가까이 교사로 살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니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적응할만하면 바뀌는 교육 정책 때문에 ‘방향’보다는 ‘속도’에 치우친 것도 사실이니까요.
작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통합사회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사회 교과서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디지털교과서는 함께 집필하는 동료 교사들의 단골 이야기 주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다 보니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대상과 쓰임, 내용의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는 세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융통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한계를 직접 극복하고 싶어 무모하게 교과서 집필에 도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현장에서 느낀 교과서의 문제를 생각하며 학생의 경험을 기반으로 소재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가장 논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성역 없는 사회문제를 담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집필을 거듭할수록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생각은 부담으로 다가왔고 스스로 내용 검열을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으로 한 발짝 나아가긴 했지만, 내용의 기준을 국가가 결정하고 내용을 심의하는 교과서 발행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라도 하나 배웠으니 다행이라고 하기엔 지금까지 들인 노력이 허무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과서 집필진들이 느꼈을 무력함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그들에게 향한 제 비판을 그만 거두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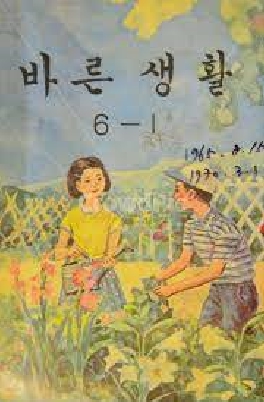
국가의 교과서 발행 시스템의 문제를 많은 국민들이 느끼게 된 최근의 사례로 박근혜 정부 시절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교과서의 발행과 채택에서 국가기구의 간섭과 통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독일의 경우 예외적으로 검정 절차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기본 취지와 운영 폭으로 볼 때 영국이나 프랑스의 자유발행제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유럽 각국의 교과서들은 국가교육과정을 준거로 삼아 저술될 뿐 민간 출판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발행되고 일선 교사들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발행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교과서 편찬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해치고 교과서 선택의 폭을 좁힘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OECD 34개 회원국 중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도입한 나라가 절반(17곳)에 달한다는 사실은 자유발행제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교과서 관련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디지털교과서로의 전환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을 만나 경험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자유발행제의 전면 도입입니다. 발행을 자유롭게 하고 선택은 학생과 교사가 할 수 있을 때, 교과서는 더 이상 사물함에서 잠자지 않습니다.

AI 기반의 디지털교과서를 상상해 봅니다. 국가가 정한 내용 기준을 통과해야 서술되는 교과서를 AI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쩌면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이 교과서를 사물함에 넣으세요. 방금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새 교과서를 완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