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숙의 그림책으로 본 세상]
[고양신문] ‘응시’라는 말을 인터넷 검색창에 넣으면, 뜻밖의 답이 나온다.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는 ‘응시(凝視)’라 나오고, 구글에서 검색하면 ‘응시(鷹視)’라 나온다. 응시(凝視)는 엉길 ‘응’ 자를 써서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봄.’으로 표현하고, ‘응시(鷹視)’는 매 ‘응’ 자를 써서 ‘매처럼 노려보는 것’이라 표현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았다. 두 가지 모두 적혀있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응시’는 응시(凝視)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갑자기 궁금해진다. 그림책 『응시』(김휘훈 지음, 필무렵)는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
캄캄한 물속, 멀리서 빛나는 눈빛이 보인다. 가까워진다. 거북이다.
‘거기 있었구나. 한참을 찾았어.’
매서워 보이는 거북이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윽고 찾는 그 무엇을 발견한 표정이다.
‘빛 한 줄기 안 드는 이곳에 또 누가 온다는 말이니?’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일까?
‘아무도 안 와.’
비장한 거북이 눈빛이 아까보다 더 빛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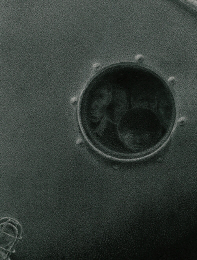
장면은 바뀌어 축제가 한 창인 물 밖의 세계. 사람들은 모두 즐거워 보인다. 어두운 밤하늘, 모두 하늘을 쳐다본다. 아마도 불꽃놀이가 시작되나 보다. 저마다 휴대전화를 하늘로 향하고 있다.
그 순간, 커다란 거북이가 하늘로 날아오른다. 아, 아까 그 거북이다. 놀라는 사람들. 거북이 눈에는 리본처럼 보이는 노란 꽃빛장식이 달려 있다.
다시 장면이 바뀐다.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아이 하나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본다. 응시한다.
응시.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본다는 것은 바라보는 ‘순간’의 연결 아닐까? 결국 ‘시간’이다. 내 눈길을 모으는 시간, 그리고 똑바로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 스치듯 보거나, 잠깐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계속 보는 것 말이다.
9년. 어쩌면 많은 것이 희미해졌을 수 있는 시간. 눈길을 돌려 다른 것을 보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맘때가 되면 여전히 장면들이 떠오른다. 서서히 가라앉다가 뒤집히는 배. 늘어나는 숫자. 100, 200, 304. 울부짖는 사람들. 노랗게 나부끼는 리본들.
다시 생각한다. 내 눈이 기억하고 있구나. 다만, 응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그래, 잊었는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이 두 번 바뀌고, 또 많은 사건 사고가 계속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나라에,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 살면서도 내 눈은 흐릿해졌구나.
거북이는 말한다. ‘아무도 안 와.’
하지만, 또 말한다. ‘따라오렴. 함께 오르자꾸나.’
그렇게 노란빛을 안고 떠오른다.

창문을 연다. 그리고 어두워진 밤하늘을 본다. 응시한다. 떠올라 그 밤하늘에서 나를 보는 거북이를.
언제까지 봐야 하냐고? 그건 모르겠다. 아마 수많은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고, 그 느낌표가 마침표로 바뀔 때쯤이라고 해둘까?
하지만, 아직은 응시(凝視)할 때이다. 응시(鷹視)할 때이기도 하다. 눈을 매처럼 모으고 똑바로 봐야 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