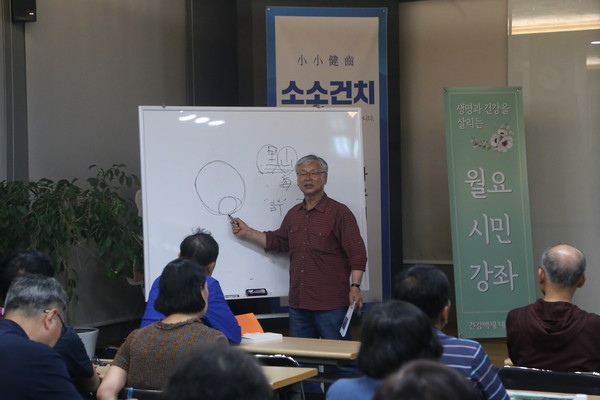월요시민강좌 –박봉우 교수 ‘마을숲의 어제와 오늘’
[고양신문] 지난 26일 사과나무치과병원 7층 강의실에는 오랜 세월 사람과 함께 한 숲인 ‘마을숲’에 관심 있는 이들이 모였다. 고양신문·건강넷·사과나무의료재단 주최의 ‘생명과 건강을 살리는 월요시민강좌’에서 박봉우 강원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명예교수가 ‘마을숲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기 때문이다.
박봉우 명예교수는 1992년 (사)숲과문화연구회 만들어 회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운영이사를 맡고 있다. 학교에서는 공원계획 설계, 식재계획 설계, 환경생태학 등을 강의해왔다. 특히 서른살을 훌쩍 넘긴 숲과문화연구회는 그동안 『숲과 문화』라는 회지를 발간하고, ‘아름다운 숲 찾아가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 나무와 숲, 인간의 상호 관계를 문화적, 생태적 시각에서 그 가치와 중요성을 깊이 연구해왔다. 그렇다고 숲과문화연구회가 학술계 인사들에 한정된 단체는 아니다. 숲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에게도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이날 박봉우 교수가 강의한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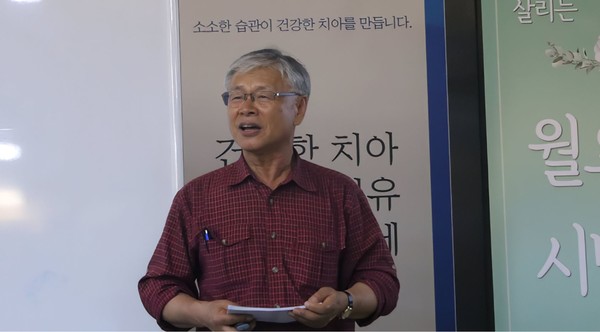
마을숲은 마을사람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숲이다. 그래서 마을의 역사, 문화, 신앙 등을 품고 있다. 마을숲은 지역의 문화경관으로 마을과 ‘이와 입술’의 관계라 볼 수 있으며 ‘마을의 품격’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마을숲은 마을과 인근 지역사회에 추억을 만드는 기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소외’를 타개하는 지역공동체의 소통공간이자, 치유의 공간(Green Therapy)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마을숲을 ‘임수(林藪)’라 불렸는데, 임수는 나무가 수없이 많아 빽빽하게 우거진 숲으로 특별하게 취급된 숲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임수란 마을의 울타리를 말하는 것으로 마을의 기본 터전을 보호하는 숲으로도 볼 수 있다.
마을숲은 개인 주거지의 울타리를 외연으로 확장해 주는 더 큰 울타리 기능을 했다. 울타리 내부의 마을 공간은 때로는 마치 확장된 개인 주거지 공간으로의 공간감까지 느끼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을숲으로 둘러싸인 한정된 공간은 마을 하나하나를 단위마을로 인식하게 하여 마을 고유의 이름을 가지게 하는 구획 틀로서의 기능도 했다.
한국의 전통 마을숲은 마을의 전, 후, 좌, 우 방향에서 필요한 곳에 위치시킨 인공숲이 많았으며 마을 숲은 훼손이 불가한 신성한 장소로 취급했다. 훼손한 사람은 재앙을 당한다고 믿었다. 그렇지만 의례를 행하는 기간 이외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오늘날의 공원과 같은 공간이었다.
한국의 전통 마을숲은 기능적으로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풍수지리 사상에 바탕을 두어 마을의 외연부를 형성하는 ‘비보림’. 전통 종교적 기능을 하는 ‘성황림’, 나정 숲, 계림 등 역사와 전설을 가진 ‘역사림’, 마을 경관에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일상생활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는 취향을 반영한 ‘경관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마을숲은 춘천 올미마을의 심금솔숲, 춘천시 동면 지내리 소양강변을 따라 위치한 지내리 솔숲, 경북 의성 사촌가로숲 등이 있다. 특히 심금솔숲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 마을 주민들이 일종의 계 조직으로 조성한 숲이다. 심금솔숲은 경작지가 펼쳐진 허한 공간을 보호하고 북한강에서 불어오는 겨울철 서북풍을 막아주는 기능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솔숲 내 건축물이 듬성듬성 들어서면서 경관을 헤치고 있다. 더구나 ‘경관건축물’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건축물에 시상까지 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진다.

하지만 마을숲의 현대적 지위는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전통생태학적 지식(TEK,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이 부각되면서 반전을 가져오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방치, 주민의 인식 부족, 토지 소유자의 재산가치 요구 등으로 문화재 지정의 어려움도 상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마을숲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주민역량 강화이다. 마을숲이 있는 장소 특유의 정체성을 주민들의 공유하고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를 함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