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넷 ’월요시민강좌’
『고양 하천 이야기』 유경종 저자 강연
![유경종 고양신문 기자가 '이야기 따라 걷는 고양의 하천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황혜영 기자]](https://cdn.mygoyang.com/news/photo/202310/75885_106509_348.jpg)
[고양신문] 고양시에는 몇 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을까. 정확히 78개의 하천이 있다. 23일 고양신문·건강넷·사과나무치과재단이 주최한 <생명과 건강을 살리는 월요시민강좌>에서 유경종 고양신문 기자가 들려준 말이다. ‘이야기 따라 걷는 고양의 하천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고양시의 숨겨진 하천 이야기는 흥미진진했다.
유경종 기자는 본지에 고양의 역사와 문화, 생태와 관련된 기획기사를 연재했다. 고양신문 유튜브 채널 ‘고양팟’을 기획ㆍ진행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숲길과 골목길, 하천길을 걷는 게 취미라고 한다.
작년 말에는 고양하천연구회 한기식 대표와 함께 『생명과 역사의 숨결이 어우러진 고양 하천 이야기』를 공저한 바 있다. 현장을 구석구석 발로 돌면서 만든 결과물이다. 책에는 고양의 하천과 탐방길 20여 곳을 소개하고 있다. 고양시 생태하천과 지원으로 출간된 비매품이지만, 가치는 뛰어나다는 평이다.
한기식 대표는 고양자전거학교 대표이기도 하다. 10여 년 동안 고양시 하천을 샅샅이 조사하고 매년 하천 지도를 업데이트하고 있어 ‘고양의 김정호’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한 대표는 “내 고장의 하천 자료를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하천 지도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강연에서 유경종 기자는 △우리가 하천을 보는 관점 △생태 하천의 중요성 △고양시 하천에 얽힌 생태와 역사, 문화 이야기를 폭넓게 들려줬다. 이날 강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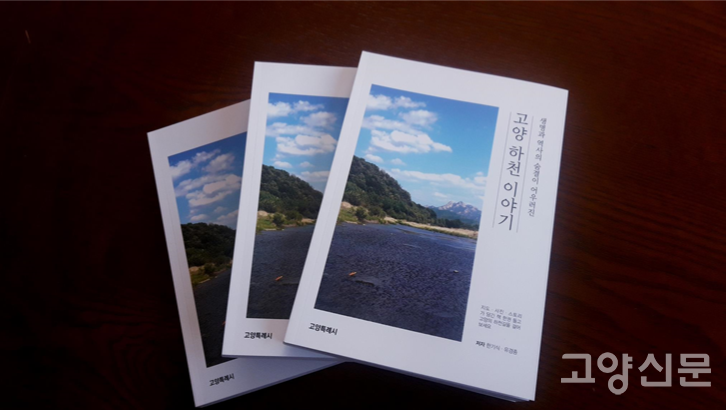
가까이에 있는 고양의 하천
근대 사회가 도래하기 전, 하천은 우리네 삶의 터전이었다. 식수를 얻었고, 농사를 지었으며, 교통수단으로 활용했다. 동네 이름을 말할 때 쓰는 ‘동(洞)’이라는 글자는 물 주변에 모여서 사는 곳을 뜻한다. 주엽동의 한자를 풀이해보면 ‘물가에 나뭇잎이 떠다니는 동네’를 뜻하고, 백석동은 ‘물가에 하얀 돌멩이가 있는 동네’를 의미한다. 동이라는 글자 자체가 사람들이 물 근처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말한다.
하천을 보는 관점... 치수(治水), 이수(利水), 친수(親水)
하천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시간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역동적인 생태계이다. 인간이 하천을 바라보는 관점은 역사 이래로 여러 차례 진화했다. 처음에는 ‘물을 다스린다’는 치수의 개념으로 생각했다. 물은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고,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고양시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 이후, 1990년 한강 제방 대보뚝 붕괴라는 엄청난 수해를 겪었다. 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생존에 커다란 위협이 따랐다. 치수 행정의 대표적인 예는 튼튼한 제방 쌓기와 배수펌프장 만들기다. 고양시에는 신평배수펌프장을 비롯해 대형배수펌프장이 여럿 있다. 1992년을 분기점으로 고양시는 신도시가 됐다. 그 이전까지는 지금과 전혀 다른 동네였다. 농경이 중심인 농업 지역이었고, 북한과 가까운 접경 지역이었고, 여러 면에서 낙후된 곳이었다. 1990년 한강 제방의 붕괴는 이전 시대의 마지막을 매듭짓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1998년에 완성된 자유로의 건설은 한강의 범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도시로 이어졌다.
한강변을 따라 이어졌던 고양시 하천들은 감조하천으로 조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서해 바다에 밀물이 들어오면 위쪽까지 물이 차고, 물이 빠지면 갯벌처럼 된다. 제방을 높여 위쪽에서는 농경지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정비했고, 구불구불하던 감조하천을 직선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 지금의 지형이 완성됐다.
![[사진=황혜영 기자]](https://cdn.mygoyang.com/news/photo/202310/75885_106511_349.jpg)
이수란 물을 이롭게 사용하는 개념이다. 옛날에는 하천 변에 염색 공장이나 피혁 공장처럼 물을 많이 쓰는 시설들이 다수 있었다. 하천물을 사용하고 나면 그 폐수를 그대로 하천에 흘려보냈다. 70~80년대까지는 수질보호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으나, 지금은 생활폐수를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재이용수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맑고 깨끗해 새들이 오고 물고기도 살고 있지만, 사람이 직접 접촉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한계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하천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쾌적하게 살고 싶다는 사람들의 욕구도 커졌다. 요즘 추세는 하천을 친수 공간으로 꾸미는 것이다. 하천에 데크를 만들고 그곳에서 문화 행사를 한다. 물을 다스리는 치수와 그 물을 이용하는 이수, 그곳을 즐길 수 있는 친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천을 이용해야 한다. 고양시도 행주산성과 대덕생태공원 등을 시민들의 행복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하천은 모든 생명의 마지막 보금자리다. 최근 들어 하천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있다. 바로 생태다. 인간만이 자연의 주인공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에서부터 고민이 출발한다. 하천은 습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들의 마지막 보금자리다. 새와 물고기, 육상 동물과 숲속 곤충 등은 도시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도시는 인간들이 사는 공간이지만, 도시 안에는 다른 생명들도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치수, 이수, 친수를 지향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생명체들을 배려하는 균형 감각도 있어야 한다.
최근 창릉천이 3200억원 규모의 ’국가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되면서, 고양시의 가장 큰 행정적인 성공 사례로 홍보되고 있다. 하지만 개발 내용을 보면 생태적 관점이 포함되지 않아 우려가 크다. 하천을 ‘뭇 생명들이 어울려 살아가야 할 생태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입하면 개발의 방향성이 명확해지리라 본다.
![[사진=황혜영 기자]](https://cdn.mygoyang.com/news/photo/202310/75885_106510_349.jpg)
고양의 하천
2023년 현재, 고양시에는 국가 하천인 한강을 비롯해 18개의 지방 하천과 59개의 소하천이 흐른다. 창릉천, 공릉천, 장월평천 같은 지방 하천과 용두천, 향동천, 내유천 등의 소하천이 있다. 소하천은 지방 하천으로 합류하고, 지방 하천은 국가 하천으로 합류한다. 총 78개의 크고 작은 하천들은 개발로 인해 숫자가 자주 바뀐다. 고양을 자주 걷게 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사람들은 모두 하천변에 모여 살았고, 마을 이름에는 하천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수역이마을에는 수역이천, 두포동에는 두포천, 한우물마을에는 한우물천이 있다. 예쁜 하천 이름들도 많다. ‘장월평천(獐越平川)’에서 장(獐)자는 노루 장자다. 물가에 사는 사슴이라고 불리는 고라니는 고양시의 여러 곳에 이름이 남아 있다. 아람누리에는 노루목 극장이 있고, 장항동과 장항습지도 노루목을 한자로 표기한 명칭이다.
하천길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재도 다양하다. 창릉천의 강매석교와 행주수위관측소, 오금천과 공릉천이 만나는 신원동 덕명교비 등이 있다. 공릉천의 송강시비공원, 창릉천의 의병대장 이신의 기념관, 선유천의 이호철 소설가의 집도 재미있는 문화 콘텐츠다.
옛날 한강 일대의 고양시는 사람과 고라니, 웅어와 말똥게, 저어새 등이 공존하던 땅이었다. 간척 사업과 정비 사업, 그리고 자유로 등을 지속적으로 건설하면서 현재의 도시가 완성됐다. 마을 이름이 무슨 뜻일까를 공부해 보니 옛날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고, 역사와 공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생태적 감수성 찾아주는 하천나들이
금강이나 섬진강이 더 아름답겠지만 쉽게 가기는 힘들다. 고양시의 하천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다. 그곳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살아 있는 생태계를 볼 수 있다. 11월 4일에는 고양신문 주최로 ‘고양바람누리길걷기축제’를 한다. 호수공원에서 출발해 행주산성을 거쳐 북한산까지 25㎞를 걷는다. 이 행사에 참가해 하천길을 함께 걷고, 자기만의 하천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우리 주변의 생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생태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나도 그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된다. 가까이에 있는 고양의 하천을 나들이하면서 그런 감수성을 찾아보시길 제안 드린다.
![[사진=황혜영 기자]](https://cdn.mygoyang.com/news/photo/202310/75885_106512_3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