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책모임 중독자의 고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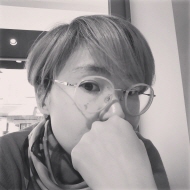
[고양신문] 4월 16일 아침, 나는 광주 조선대병원에 있었다. 전날 아버님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는 했지만, 아직은 보내드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슬픔이 코앞까지 찾아오진 않았다. 의식 없는 아버님이 혹시나 깨어나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하며 대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오전 10시경이었을 것이다. 승객 전원 구조라는 자막이 달린 속보 뉴스를 보았다. ‘그래, 다행이네,’ 하는 생각뿐이었다. 당장 눈앞에 생사를 오가는 아버님과 그걸 두려워하는 남편을 위로하는 데 온 신경이 쏠려 있었다. 이것이 끔찍한 사고였다는 걸 몇 시간 뒤 알게 되었지만, 내 집안에 닥친 불운이 더 슬프고 괴로웠다.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건 몇 년 뒤였다. 아버님은 다음 해 여름 돌아가셨고, 우리 가족이 그 빈자리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다. 일상으로의 복귀가 죄스럽지 않을 때쯤, 세월호의 슬픔이 발끝부터 차올랐다. 나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어째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계속 길을 떠돌아다녀야 하나. 구조자들은 왜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고, 결국 목숨을 저버리는 일까지 생기나. 책임자 처벌은 왜 이다지도 미미하고, 밝히지 못한 진실이 있을 것 같은 의문은 왜 해소되지 않는가. 봄이 되면 활짝 핀 꽃을 보고 배시시 웃다가도 뒤돌아서면 이런 평안함이 미안했다. 일상의 작은 기쁨과 행복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아니라는 생각이 가슴을 짓누르곤 했다.

1994년 태어난 ‘나미노우에호’는 말한다. 18년 동안 일본 남쪽 바다를 오가고 난 뒤, 이제 그만 쉬어야 마땅했다고. 하지만 2012년 우리나라에서는 이 배를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 증축한 뒤 ‘세월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고작 3년을 못 버티고 세월호는 침몰했다. 304명의 승객과 함께. 세월호와 함께 수많은 꽃들이 졌다. 숨들이 졌다.
세월이 흘렀다. 세월호는 생각한다. 세월을 거슬러오를 수 있다면 수많은 꽃들을 품고 파도 위로 솟구치고 싶다고. 더 일찍, 더 강하게 신호를 보내 ‘세월호’라는 이름을 달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발가벗겨져 샅샅이 수색당하는 걸 허락했는데도,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지 못해 미안하다고. 목적지에 닿지 못하고 놓쳐 버린 승객을 찾지 못해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세월호 참사 10주기다. 누군가에게는 벌써 10년이고, 누군가에게는 이제 10년이다. 고양시에서 10주기 행사를 진행하며 광장에서 시민들을 마주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매년 봉사를 자원했던 청소년과 청년들. 10년의 세월은 이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로 바꾸어 놓았다. “세월호 참사 알죠?” 하는 질문에 “네” 하는 대답이 들려오지 않는다.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라는 배가 있었어요”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시작해야 한다. 백 마디 말보다 ‘세월호’라는 단어 하나와 눈빛으로 설명되던 세월이 지나가 버렸다. 세월호 참사가 현재진행형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으로 변해 가는 시기가 된 듯하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것이 세월이 가진 힘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세월호는 증거다. 목포 신항만의 한 모퉁이에 꿋꿋이 버티고 서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참사를 끝끝내 증언할 것이다. 지나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 다가올 세월을 의미없이 흘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세월호이기 때문이다. 내가 수명이 다해서 스러지면, 또 다른 누군가 자기 수명이 다할 때까지 증언할 것이다. 세월은 잊는 힘도 강하지만 기억하는 힘도 강하다. 세월호의 생몰연도는 1994년에서 2014년이만, 노란 리본은 2014년에 태어나 오랫동안 매듭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매년 4월 16일, 아니 4월은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 그리고 희망의 세월로 자리잡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이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