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규 사과나무치과병원 구강내과 센터장의 건강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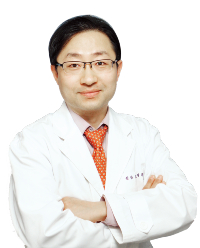
[고양신문] 턱관절 장애로 치과를 찾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턱관절 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47만 명으로 매해 약 4%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기온이 낮아지면 몸을 웅크리면서 턱관절 주변도 근육이 뭉쳐 신경과 혈관이 수축할 수 있다. 또한,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되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를 꽉 깨무는 습관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턱관절은 아래턱뼈와 머리뼈 사이의 일명 디스크라 말하는 턱관절 관절 원판 등의 주위를 통틀어 일컫는다. 관절과 디스크뿐만 아니라 저작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턱관절 장애라 말할 수 있다.
턱관절 장애 원인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유전적인 골격 구조 외에도 턱 괴기,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저작 습관 등도 턱관절 장애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초기에는 턱관절 주변부에 뻐근함이 느껴질 수 있고, 입을 벌릴 때나 하품을 할 때 ‘딱’, ‘뚝’ 등의 소리가 나면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조기 진단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통증이 극심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성 개구 장애로 악화하면 움직임이 제한돼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넘어 안면 비대칭까지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턱관절 장애는 복합적인 요인이 대부분이며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워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증상과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약물요법이나 적외선 온열치료와 같은 물리치료 등을 시행해 개선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면 근육에 시행하는 보톡스 주사나 교합 안전장치를 장착해 위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치과에서 턱관절 장애를 치료할 때 이용하는 교합 안전장치인 스플린트는 치아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교정장치와는 다르다. 먼저 치료 목적에 맞는 교합 안전장치 종류를 선택해야 하며 환자 개개인의 치열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혹시 모를 부작용까지도 대비해야 하므로 구강내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으로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구강 구조의 문제로 발생한 경우 교정과와 협진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도 좋다.
턱관절 장애 발생 시엔 치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철저한 관리가 동반해야 한다.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고 있다면 고쳐야 하고, 평소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즐겨 먹는 것도 피해야 한다. 또한, 심리적인 요인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불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의식적으로 턱관절에 계속해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항시 긴장을 푸는 노력도 필요하다.
오정규 사과나무의료재단 사과나무치과병원 구강내과 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