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거리』 (전소영 지음, 달그림)
『우리 사이에는』 (신순재 글, 조미자 그림, 천개의바람)
[고양신문]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다른 때면 몰라도 이런 상황에서 그 후보를 찍는다는 건.
하지만 나는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보는 안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도대체 왜 그 후보를 찍을 거냐고 묻지도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를 찍은 사람을 두고 온갖 비난이 오갔다. 나도 직접 비난의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잔뜩 욕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욕을 엄마에게 할 수는 없었다. 궁금하긴 했다. 엄마는 왜 그 후보를 선택했을까?
“적당해서 그래. 뭐든 적당한 건 어렵지만 말이야. 적당한 햇빛, 적당한 흙, 적당한 물,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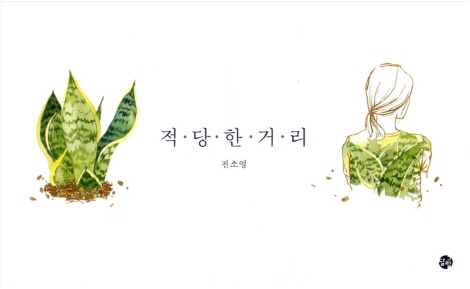
작가는 그림책 『적당한 거리』(전소영 지음, 달그림)에서 “어쩌면 그리 화분을 싱그럽게 잘 가꾸냐?” 묻는 친구에게 이렇게 답한다. 말은 쉽지만, 집에서 화분을 키워 본 사람이라면 안다. 그 ‘적당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바람도 적당히, 물도 적당히, 햇볕도 적당히. 그런데 그 적당함은 한 번 배운다고 끝나지 않는다. 같은 화분이라도 어떤 날은 물을 듬뿍 줘야 하고, 또 어떤 날은 가만히 두는 것이 좋다.
“도대체 적당한 거리가 뭔가요?” 묻는 사람에게, 작가는 이렇게 덧붙인다. “가만 보면 식물들도 성격이 모두 달라. 어떤 식물은 물을 좋아하고, 어떤 식물은 물이 적어도 잘 살 수 있지. 한 발자국 물러서서 보면 돌봐야 할 때와 내버려 둘 때를 조금은 알게 될 거야.”
결국 ‘적당한 거리’를 두기 위해 필요한 건 잘 바라보는 것이었다. 등을 돌리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눈을 향한 채로 뒷걸음치는 것. 상대가 지금 어떤지 살피는 것. 그래야 비로소 적당한 거리가 가능해진다. 그렇게 생긴 거리는 어쩌면 ‘사이’라는 말로 바꿔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 나온 그림책 『우리 사이에는』(신순재 글, 조미자 그림, 천개의바람)은 이 ‘적당한 거리’를 ‘우리 사이’라는 말로 해석한다. 시무룩한 얼굴의 양이 산딸기를 따고 있는 늑대에게 다가온다. 양은 여우에게 들었다며, “양과 늑대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말에 늑대는 대답한다. 우리 사이에는 딸기 넝쿨이 있고, 딸기가 있고, 나비가 있다고. 또 노래와 웃음이 있고, 잔뜩 딴 딸기를 끓이는 맛있는 냄새도 있다고.
“나와 너 사이에는 길이 있어. 너와 나 사이에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기도 해.”
양과 늑대는 자신들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찾아본다. 그러면서 둘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는 것도, 또 생각보다 많이 같다는 것도 알게 되는 과정이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거리에는 말하지 않은 물음이 있고, 끝내 꺼내지 못한 말이 있고, 서로를 향해 조심스레 뒷걸음치는 마음이 있다. 엄마와 나 사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선택의 틈에도 아마 딸기 넝쿨 같은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을지 모른다. 냄새로만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의 보글거림, 지금은 다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함께 나눌 수 있을 맛이 있을지도.

선거는 끝났고, 삶은 계속된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사이를 ‘우리 사이’라 부르며 살아가야 한다.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조금 더 내어주는 방식으로. 아니, 그러기 어렵다면 등을 돌린 채 비난만 하기보다는, 눈을 마주치고 가만히 바라보는 방식으로. 적당한 사이를 두고.

